차근욱 공단기 강사
그다지 술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던 무렵, 존경하는 김희순 교수님과 밤새 술상을 앞두고 이야기하던 기억만은 또렷이 남아있다. 그 때의 나는 스무 살을 갓 넘긴 무렵이었고 이런 저런 고민이 많았었다.
그 당시의 가장 큰 고민은 ‘민법’이었는데, 법대를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은 도무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느낌이었다. 하나하나는 그럭저럭 알겠는데, 결국 조합해 본다면 전체가 보이지 않는 느낌이었달까.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수업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들었던 분이 바로 김 교수님이셨다. 김희순 교수님은 그야말로 ‘걸어 다니는 민법’이셨는데, 장비와 같은 포스를 풍기시면서도 이름이 이름인지라 대학 입학 후 신입생 환영회 전까지 많은 선배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는 자랑도 술을 한 잔 하시면 꼭 잊지 않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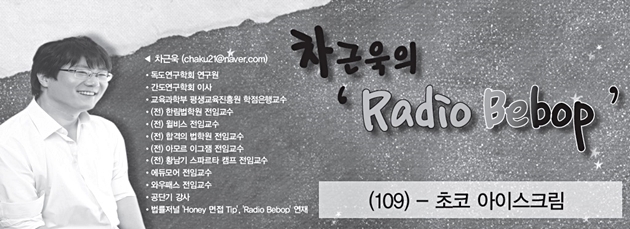
김희순 교수님께는 배운 것이 참 많았다. 민법도 배웠고 인생도 배웠고 술도 배웠다. 김희순 교수님께서는 참으로 술을 좋아하셨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漁心’이라는 선술집에 가서 늦게까지 술을 드시는 경우가 많았다. 덕분에 나도 수업이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어심’에 갔다.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즐겁게 술을 마셨던 때였기도 했고, 유일하게 자주 술을 마셨던 때였기도 했다. 그 이후로는 술을 그리 자주 마시지도 않았고 그리 즐겁게 마시지도 못했으니까.
김희순 교수님은 지금까지도 내내 가슴 속으로 닮고 싶은 분이셨다. 누구보다 쉽게 강의하셨고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민법을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김희순 교수님의 수업을 몇 번이나 듣고 책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도 도무지 민법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김희순 교수님은 ‘아이구~ 이 민법 지진을 어쩌면 좋으냐’라고 하시며 허허 웃으셨다. 지금 돌아보면 내가 민법을 당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탓이었는데, 법을 단순히 어떤 억압으로서만 생각하다보니 민법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김희순 교수님과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던 무렵 자주 밤새 술을 마셨다. 뭐, 난 술을 잘 못하니까 술을 마셨다기보다는, 안주를 연신 먹다가 목이 막히면 술을 한 모금 하는 정도였지만.
아침 6시 즈음이 되면 술자리를 파하고 귀가를 했는데, 그 때에는 김희순 교수님은 아이스크림을 사주셨다. 서늘한 아침 공기에 아이스크림까지 먹다보면 정신이 번쩍 나는 기분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초코 아이스크림이 좋아, 술자리가 파하면 새벽의 파르라한 하늘과 함께 먹는 초코 아이스크림은 그렇게 맛이 있었다. 세상의 인연이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인지라, 어찌하다보니 김희순 교수님을 뵌지도 오래되게 되었지만 마음 속 깊이 담은 감사함은 잊을 길이 없어 그 이후에 열심히 민법을 공부했던 기억이 난다. 정말 민법을 잘해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일 정도였으니까.
민법을 못한다는 것은 김희순 교수님께 참 죄송스러운 일이었다. 그렇게 살펴주시고 그렇게 알려주셨는데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 그 결과였는지는 몰라도 제법 시간이 지난 뒤에는 학점은행에서 민법을 강의하게 되었었다. 내가 민법을 강의하게 된 이유는 나처럼 민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왜 민법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고, 김희순 교수님의 흉내를 내보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강의를 하면 할수록 김희순 교수님께서 얼마나 탁월하게 민법을 잘 알려 주셨는지를 깨달을 뿐이었고 얼마나 민법을 잘 알고 계셨는지를 새삼 느낄 뿐이었다. 결국 스승의 그림자에 누가 된 것은 아닌지 그저 부끄럽다는 생각만이 들었다.
몇 일전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문득 초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졌다. 그저 아무 가게에나 들어가 전혀 맛있어 보이지 않는 초코 아이스크림을 사서 한 입 베어 물었다. 이제는 아무리 고급이라고 해도 잘 먹지 않게 된 아이스크림이었지만, 어찌되었든 먹고 나니 스무 살이 조금 넘었던 시절의 내가 떠올랐다. 어리숙한 주제에 꿈만 많던 자신이.
차가운 바람으로 또 하나의 계절이 스쳐간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느덧 잊어버렸던 추억이 새롭다. 이제는 ‘어심’도 없어지고 말았으니 나는 어디로 가서 술을 한 잔 해야 하나.
그 조촐했던 자리의 흐드러지던 웃음이 아련하다. 산다는 것은 어쩌면 많은 것을 잃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많은 것을 얻을수록, 우리는 또 많은 것을 잃고 만다. 잃어가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하여도 마음에 뚫리는 구멍은 어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가슴이 그저 먹먹해 애꿎은 초코 아이스크림만을 베어 물지만, 나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지 못함을 안다. 아무것도 몰랐지만, 모든 것을 하고 싶던 그 시절로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가을이 깊어간다. 상념도 깊어간다. 추억은 그렇게 색을 더해 간다. 문득 민법 책이 보고 싶어졌다.
김희순 교수님, 그립습니다.


